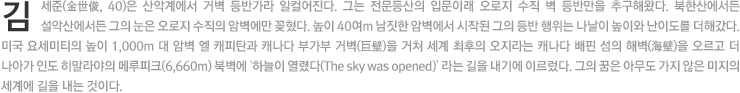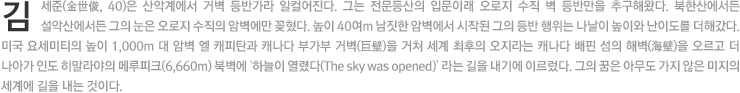|
메루피크 정상에서, 하늘의 길을 열었다는 성취감에 눈물을 흘리다

지난해 7월 김세준은 인도 히말라야의 메루피크 북벽을 등반했다. 메루피크는 에베레스트(8,848m)나 K2(8,611m)처럼 이름난 8천 미터급 고봉은 아니지만, 높이 600m 높이의 북벽은 당시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험난한 벽이었다. 메루피크 북벽에 도전한 김세준과 왕준호, 김태만 세 클라이머는 벽 등반 기점까지 장비와 식량을 올리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북벽은 먹구름 속에 얼굴을 감춘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간 기다리다 식량이 아슬아슬해지자 김세준 대장은 결단을 내렸다. 단 한번의 시도로 정상까지 밀어붙이자는 계획이었다. 세 대원은 7월 5일 C2(6,150m)를 출발한 이래 13일까지 자벌레 같은 오름짓을 매일 매일 거듭했다. 바위틈에 박힌 눈과 얼음을 파내며 암벽을 오르는 것만도 고통스런 일이건만 총알 날아가는 소리를 내며 퍼붓는 낙석과 스노 샤워(snow shower, 눈가루가 퍼붓는 현상)는 툭하면 긴장케 하고, 어렵사리 설치한 확보물이 빠질 때는 1,000m 아래 빙하로 처박히는 듯해 심장이 콩알만해지곤 했다. 추락의 공포로 인한 극도의 긴장은 몸을 마비시켰다.
빙하가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암벽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면 허공침대를 설치해야 했다. 고된 하루를 마친 뒤 드러눕는 허공침대는 따스한 방 이상으로 안락했다. 하지만 쇠못 두세 개에 매단 허공침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대도 기우뚱거려 가슴 졸이게 했고, 눈보라가 치면 침낭뿐 아니라 얼굴마저 허옇게 덮어 온몸이 얼어붙게 했다. 매일 새벽 첫 등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두 사람이 허공침대에서 짐을 정리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등반에 나섰다. 어느 날 김세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졸음이 덜 깬 상태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어느 순간 로프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김세준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꿈을 꾸고 있나 싶었다. 선등에 나선 왕준호가 추락하면서 로프가 딸려나가는 상황이었다. 곧 로프가 팽팽해지면서 왕준호는 줄에 거꾸로 매달렸다. 왕준호는 한 시간 반이나 오른 게 허사가 됐다며 욕 한번 해대는 것으로 추락의 충격을 떨쳐 버렸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온 몸에서 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등반을 해야 하는 것 또한 고통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등반 8일째, 모든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다. 1주일로 예상하고 나선 등반이 뜻밖에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굶주림은 익숙해질 수 없는 고통이었다,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것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헛구역질은 속을 또 다시 뒤집어놓았다. 그래도 김세준 대장과 왕준호, 김태만 대원의 머릿속에 포기란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한 치 한 치 내 손으로 잡는 바위는 태초이래 처음 잡는 미지의 세계이기에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정상에 서게 되리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어렵게 김세준은 후배 두 명과 함께 북벽 세계 첫 등반이란 기록을 세우며 메루피크 정상에 올라섰다. 후배들과 부둥켜안자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서 벌인 사투였지만 또 하나의 길을 완성시켰다는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늦게 시작한 등반, 그러나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